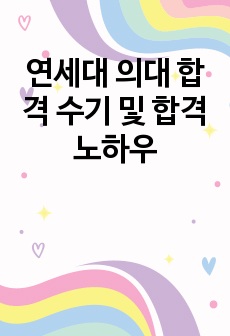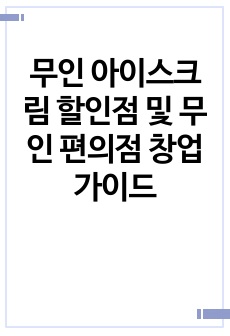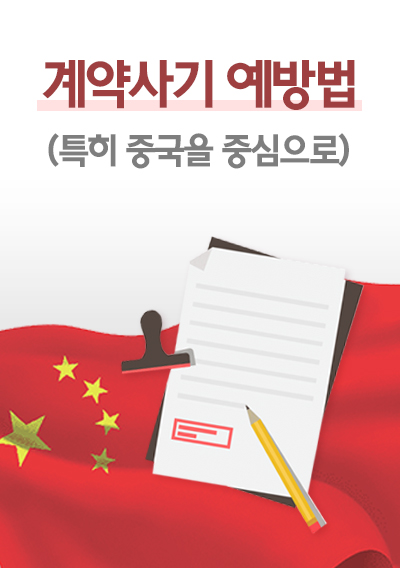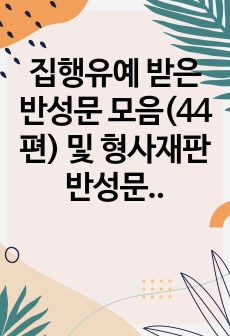[예술]안달루시아의 개와 디지털 단편영화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06.05.15
- 최종 저작일
- 2006.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에쁠 받은 보고서^ㅡ^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아무런 연관성 없는 장면 장면들 간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내재되어 있는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비평가들이 프로이트와 연관시켜서 고민 할동안, 매 순간들의 장면들은 보는 이를 자극하여 공포와 충격으로 도발한다. 창백한 달이 차가운 구름으로 스쳐 지나갈 때 여인의 눈동자는 베어나간다. 충격이 극에 달하는 오프닝이다. 눈은 가장 예민하고 외부 자극에 있어 최고의 보호 대상이기에 타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조차 큰 충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지금, 관객들, 사람들의 ‘눈’이 아니던가. (그 순간 나오는 신나는 탱고 음악, 청각적 자극으로는 결코 그러한 공포와 충격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관중들은 순간, 영화 속 인물은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은밀한 관음증을 경계받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뜨거운 감자를 훔치려다가 손을 덴 듯한 느낌 말이다.
환멸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몸짓, 몸부림. 다다이즘이나 아방가르드의 움직임이 초기의 목적의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방향적, 무목적적, 무정부적 게릴라전이었던 데에 비해, 초현실주의 운동은 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했다. ‘논리’의 허점을 짚어내는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거침없이 부정해버리는 적극적 반응이다. 영화의 각 장면들에는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양상은 이 영화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앞 장면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연결 고리 하나는, 한 남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천조각들을, 여인이 연인과 걷는 바닷가에서 흙속에 빠진 채 발견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 고리조차, 단지 전 장면의 천조각을 상기시킬 수 있을 뿐, 왜 그 천조각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논리를 부정하는 작은 저항이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영화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오프닝에서 달과 여인의 눈동자의 교차편집이나, 짧은 커트로 주는 긴장감, 클로즈업으로 강조되는 손 위의 개미들 등 모든 예술적 효과의 이면에는 ‘기술의 힘’이 내재한다. 백남준이 ‘기술의 힘’으로 만들어 냈던 세계 통합 예술, 위성예술 ‘굿모닝 미스터 오웰’역시, 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다. 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면서 적대적이기도 하다. 베이컨 이후 진행되어왔던 기술의 무한 발전은 예술의 표현 가능성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반대로 예술의 개념 자체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어 놓은 면이 있다. 사진이 갓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은 그것은 예술이 아니며,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지금 사진은 작가의 의도를 훌륭히 반영하는 예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