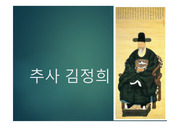-
미리보기
목차
1. 추사 김정희에 관한 일반론
1) 추사 김정희의 ‘불계공졸’
2) 스승 옹방강과 완원과의 우정
2. ‘감각 존재’로서의 <불이선란>
1) 감각 존재로서의 ‘획(劃)’
3, ‘괴(怪)’와 ‘졸(拙)’-새로운 감각 존재
4. 감각을 생성하는 ‘경주자’로서의 예술가는 어떤 자인가?본문내용
추사 김정희의 <불이선란>은 담묵(淡墨)의 난엽에 화심(花心)만 농묵으로 강조한 매우 간결한 구도이다. 이 외의 다른 풀이나 돌, 대지를 그리지도 않았고, 구도상 오른쪽의 <산심일장란>에서 보이는 ‘봉의 눈’이나 ‘메뚜기 배’와도 같은 형상도 없다. 즉 일반적인 사군자에서의 난초도와는 다른 풍격의 그림인 것이다. 사군자화는 산수화나 인물화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서예의 기법을 적용시켜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로 그림을 그리는 선비와 문인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소재였다. 또한 서예의 필력 자체가 쓴 사람의 인품을 반영한다는 원리의 연장으로 북송 때부터 사군자화는 화가들의 인품 또는 성격 전체를 반영한다고 믿어졌다. 그래서 문인들 사이에 더욱 환영받는 소재가 되었다.
그림의 형태나 기법이 간단할수록 그 소재 자체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남송 말기부터 원대(元代) 초기에는 몽고족의 지배하에서 나라를 잃고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은둔 생활을 한 문인들 사이에 무언의 저항 수단으로도 그려졌다. 유명한 예로는 원대 초기의 사대부 정사초(鄭思肖)의 난초이다. 흙 없이 난초 포기만을 그려 몽고족에게 국토를 빼앗긴 설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완당(추사의 연경 시절 후의 호)은이 난초그림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했다는 대만족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 희열을 화제로서 제시를 통해 남겼다.
“난초를 안 그린 지 스무 해인데/ 우연히 그렸더니 천연의 본성이 드러났네./
문 닫고서 찾고 찾고 또 찾은 곳/ 이게 바로 유마거사의 불이선이라네.“
완당 스스로 자화자찬의 화제를 쓰고, 여백에도 다른 화제를 쓴다.
“초서와 예서의 기자(奇字)의 법의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아보며, 어찌 이를 좋아할 수 있으랴. 구경이 또 제하다.”
유홍준은 [완당평전]에서, 이러한 완당의 넘치는 희열을 표현하곤 했던 것이 그의 많은 적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완당의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이해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오만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참고자료
· [노마디즘2] 이진경, 휴머니스트
· [철학이란 무엇인가?] 들뢰즈/가타리 지음, 이정임, 윤정임 옮김, 현대미학사
· <아이콘과 코드, 그림으로 읽는 동아시아 미학범주> 임태승, 미술문화, 2006
· <추의 미학>, 로젠 크란츠, 나남태그
-
자료후기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
추사 김정희 8페이지
Ⅰ. 서론 경주 김 씨 중에서 잘 알려진 인물을 조사해보았다. 한국사에서 19세기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최고의 글씨는 물론이고 세한도로 대표되는 그림과 시와 산문에 이르기까지 학자로서, 또는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다. 금석학 연구에.. -
추사 김정희 작품 연구 13페이지
작가 선정 이유 -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최고의 글씨는 물론이고 그림과 시와 산문에 이르기까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물 - 그의 글씨 안에 들어있는 정신세계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 추사 김정희의 연보 본관 경주 1.호: 완당, 추사 2. 생몰 1786-1856(정조10-철종7) 3...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