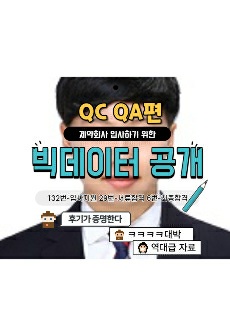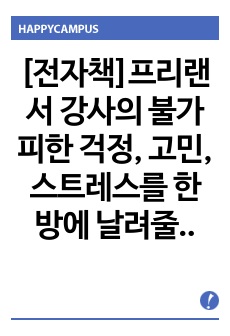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이젠 마무리할 때다
- 최초 등록일
- 2014.07.15
- 최종 저작일
- 2014.07
- 9페이지/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난 2013년 1월 8일,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법적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지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두지 말라고 한 판결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안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시기상조,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지만, 이는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는 광역단체의회의 ‘유급 보좌관제도’와 관련, “지방의원들에게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국회사무총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기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제도와 관련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6일,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접수하여 심의 중에 있다.
4천여 명의 지방의원 중 몇 사람의 탈선과 비리를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것으로 매도하면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이나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그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면 몰라도 이 정도면 이른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그런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지난 20여 년간 진부하고 줄기차게 거론해 온 지방의원의 보좌관 문제는 이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 분위기 조성의 진척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서 언
2. 지방의원 보좌인력 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진척
1) 대법원과 서울특별시의 긍정적 견해
2) 소관부처 장관의 보좌관제 소신
3) 국회사무총장의 보좌관제 찬성 견해
4) 국회의 지방의회 보좌관제 입법추진
3. 광역의원 보좌관제도의 마무리와 바람직한 정수
본문내용
지난 2013년 1월 8일,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법적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지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두지 말라고 한 판결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안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시기상조,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지만, 이는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중 략>
광역의원에 대한 보좌인력의 경우 국회의원과의 최소한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의원 1인당 1인씩의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선거구에 두 개의 광역의원선거구가 있다면, 산술적으로 광역의원의 보좌인력은 국회의원 보좌인력의 절반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대체적으로 광역의원의 4~5배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 무리한 요구로 비칠 수 있으므로 그 정수를 최소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역의원 1인에 대한 보좌인력은 최소한 1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관련 법령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 관할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편성함으로써 인구수를 사실상의 업무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난 17대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를 관할하는 선거구 출신이면서도 그 당시 6명의 개인 보좌인력을 가지게 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의 배에 달하는 광역의원에게는 단 한사람의 보좌인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