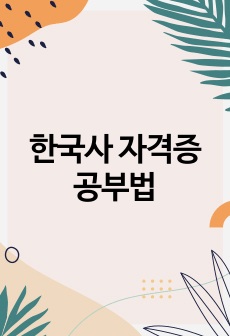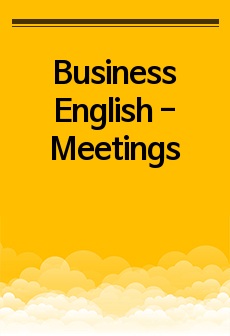조선시대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2.05.18
- 최종 저작일
- 2012.05
- 9페이지/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조선시대 족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왕실족보(王室族譜)
Ⅲ. 사가족보(私家族譜)
1. 족도(族圖)
2. 팔고조도(八高祖圖)
3. 가첩(家牒)
Ⅳ. 씨족보(氏族譜)와 만성보(萬姓譜)
1. 씨족보(氏族譜)
2. 만성보(萬姓譜)
Ⅴ. 조선시대 족보의 특징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족보는 시조로부터 혈통의 계승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선후 대수와 항렬별로 친소관계를 밝힌 기록이다. 가계기록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도 가계기록이 있었으나 족보의 형태는 아니었다. 문벌귀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보, 대수 등의 용어는 있었지만 조상의 내외관계를 기재한 것은 족도(族圖)의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는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에 들어와 왕실족보가 간행되면서 양반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15세기부터 명실상부한 족보가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족보의 제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 유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소위 `제계(帝系)`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제왕연표라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족보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현량과(賢良科)`라는 벼슬에 추천되는 방편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개인의 내력과 조상의 경력을 기록하여 그 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족보의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족보는 신분과 기록하는 방식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편찬되었다.
첫째 족보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왕실족보(王室族譜)와 사가족보(私家族譜)로 구분된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은 세계(世系)를 분명하게 하여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왕실족보를 편찬하였다. 왕실의 친족제도 정비와 왕실족보의 편찬은 사가(私家)의 족보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혼인을 통해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은 관료제와 신분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실과 마찬가지로 족보를 편찬하였다.
둘째 족보는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족도(族圖),족보, 팔고조도(八高祖圖),가첩(家牒)등으로 구분된다. 족도는 본인을 중심으로 종적인 조상세계를 계보화하고 횡적인 자녀와 내·외손의 파계를 정리하여 한 장의 도표로 만든 것이다. 족보는 조상에 대한 가계 기록을 보다 체계화하여 서책으로 편찬한 것을 말한다. 팔고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조상 내외를 고조부 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계도이다. 가첩은 가보(家譜)혹은 가승(家乘)이라고도 하는데, 동족의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직계에 한해서 발췌하고 초록한 세계표이다. 특히 가첩은 절첩본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휴대용으로 적합하였다.
참고 자료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일지사, 1983.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유형과 특징』, 2010 (239p~275p)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명호『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돌베개 , 2002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