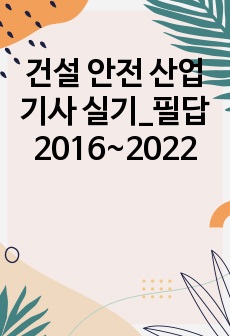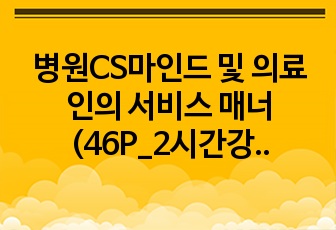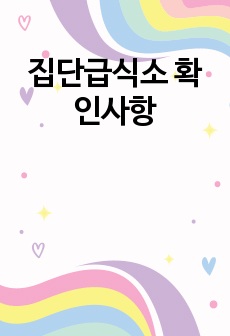소개글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29~1618 : 선조2~광해군10)은 다방면의 출중한 재능만큼이나 다채로운 행적을 남긴 인물이다. 유가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규범이 일상의 삶을 완강하게 틀 지우던 조선중기에, 당대로서는 예사롭게 생각할 수 없었던 사상과 정서와 행동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적인 삶과 문학세계를 이루었다.
교산은 『홍길동전』의 작자로서 조선의 불합리한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민중지향적인 의식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성향을 보인 그는 격화된 당쟁 가운데 발발한 임진왜란과 민생의 피폐함으로 중세 지배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 초엽을 살아가며 평탄치 않은 인생행로를 걸어왔다.
목차
1. 머리말
2. 교산의 인생행로
3. 교산의 문학세계
3.1 굽힘 없는 강한 주체성
3.2 실감나게 표현한 경험세계
3.3 기탄없이 드러낸 정(情)
4. 교산 교육론
5. 맺음말
본문내용
교산 허균은 1569년(선조2년) 강릉 사천의 양천(陽川) 허씨 집안 출생으로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성소(惺所), 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교산이 태어나 성장 ․ 활동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중세의 지배질서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의 움직임이 움트던 시대였다. 격화된 당쟁과 치욕적인 임진왜란에 이어 광해군 즉위를 둘러싼 당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중하층에서 변혁을 갈망하는 기운이 점차 확산되고 있던 시대였다.
교산의 아버지 초당(草堂) 허엽(許曄)은 서경덕(徐敬德)의 제자이자 동인의 영수로서 부제학, 경상도 관찰사, 동지 충주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허성(許筬), 허봉(許封), 허난설헌(許蘭雪軒)이 바로 그의 형과 누이였다. 그는 이런 명문가의 막내로 5살 때 글을 배워 9살에 시를 지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글재주가 탁월해 많은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며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더욱 시공부에 전념하였다. 학문은 유성룡(柳成龍)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시는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한명에게 배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달이다.
이달은 둘째 형의 친구였는데 교산에게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뒤 17살에 초시, 21살에 생원시, 그리고 마침내 26살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으로, 29세인 1597년에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듬해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다. 뒤에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형조정랑을 지내고, 1602년에 사예(司藝)․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였으며, 이해에 원접사 이정구(李廷龜)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참고 자료
김 영,「중세 권위주의에 저항한 문인-교산 허균」,『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8.
박영주,「허균 시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의 특질」,『고시가연구』제15집. 고시가연구회, 2005,
박영주,「許筠의 시적 지향의식과 `許筠詩`」,『교산 허균과 난설헌 허초희』,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 2009.
신호열 역,『국역 성소부부고Ⅰ』, 민족문화추진회, 1982.
이이화,『허균의 생각』, 뿌리깊은 생각, 1980.
장정룡,『허균과 강릉』, 강릉시, 1998.
허경진,『평전 허균』, 평민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