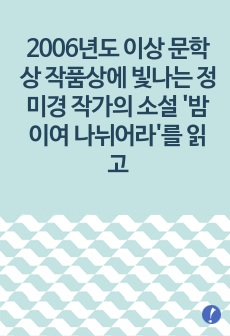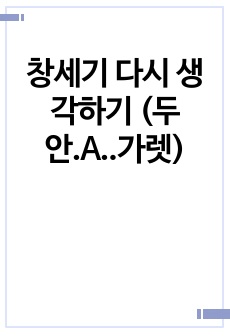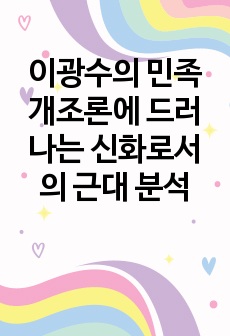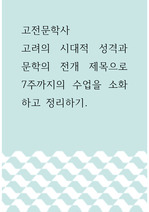-
미리보기
소개
한국문학 통사 요약목차
9.4.4. 민족문학론의 등장
9.4.5. 소설에 관한 논란본문내용
9.4.4. 민족문학론의 등장
조선후기에 이르러 ‘화(華)’의 척도로 평가되던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하자 화이(華夷)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견해가 대립되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들어서서 중세보편주의를 비판하는 민족주의가 등장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국권을 장악한 쪽에서는 ‘이’에 지나지 않는 청나라를 배격하고 중국에서는 사라진 ‘화’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북벌(北伐)의 논리를 내세워 지배체제 옹호의 명분으로 삼았다. 한편, 청나라를 ‘화’로 인정하고 배움의 대상으로 삼자는 북학(北學)노선을 주장한 비판세력은 화이론을 완화시키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근대로 순행시키는 길을 찾아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고 민족문학의 가치를 드높였다.
허균(許筠, 1569~1618)은 민족문학 인식에서도 선구자 노릇을 했다. 그는 <성수시화(惺搜詩話)>에서 정철의 가사를 들어 국문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속구(俗謳)라고 일컬은 정철의 가사 가운데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장진주(將進酒)>는 맑고 장엄한 기품을 갖추어서 들을 만하다고 했다.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중국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가의사정신(自家意思精神)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민족의식에 해당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의의를 지닌다.
조귀명(趙龜命, 1693~1737)은 중국의 옛 것을 답습해거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풍조에서 벗어나 말과 글의 불일치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문학의 독자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비교문화론의 관점을 마련해 위의 주장을 발전시켰으며 문화적인 상대주의를 중국문화와 우리문화, 한문학과 국어문학의 관계를 살피는데 적용해 중국문화 추종과 한문학 모방을 나무랐다.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節奏)를 가지면 가시문부(歌詩文賦)가 된다. 여러 나라 말이 같지 아니하나 그 나라 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에 가락을 붙인다면 천지와 귀신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중국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고 하며 형식의 특징에 따참고자료
· 없음태그
-
자료후기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
[인문]한국문학통사 요약 리포트 9.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제1기 조선후기 4페이지
9.4. 문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재검토 9.4.1. 논의 방식의 다양화 가. 문학론의 변화 고 려 후 기 ⇨ 조 선 전 기 ⇨ 조 선 후 기 문학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문학비평이 일어나, 중세후기 문학의 방향 설정함. 성리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사대부의 한문학을 중심으로 한 복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문학관 ⇒ 재도지기 문학관. 문.. -
문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재검 6페이지
1. 문학론 전개방식의 다양화 ■ 문학이 유학의 경전을 모범으로 삼고 중국 전래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심성의 바른 도리를 전하는 재도지기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바탕에 둔 문학관들이 논란을 벌임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문학담당층이 확대되고 문학의 실상이 달라지자 문학사상 또는 문학론에서도 중세적인 규범에 대한 찬반론이 전개. 송시열이 문학을 성리학의 규제..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